2017. 7. 8. 09:09ㆍ삶(각종 수업 자료)/나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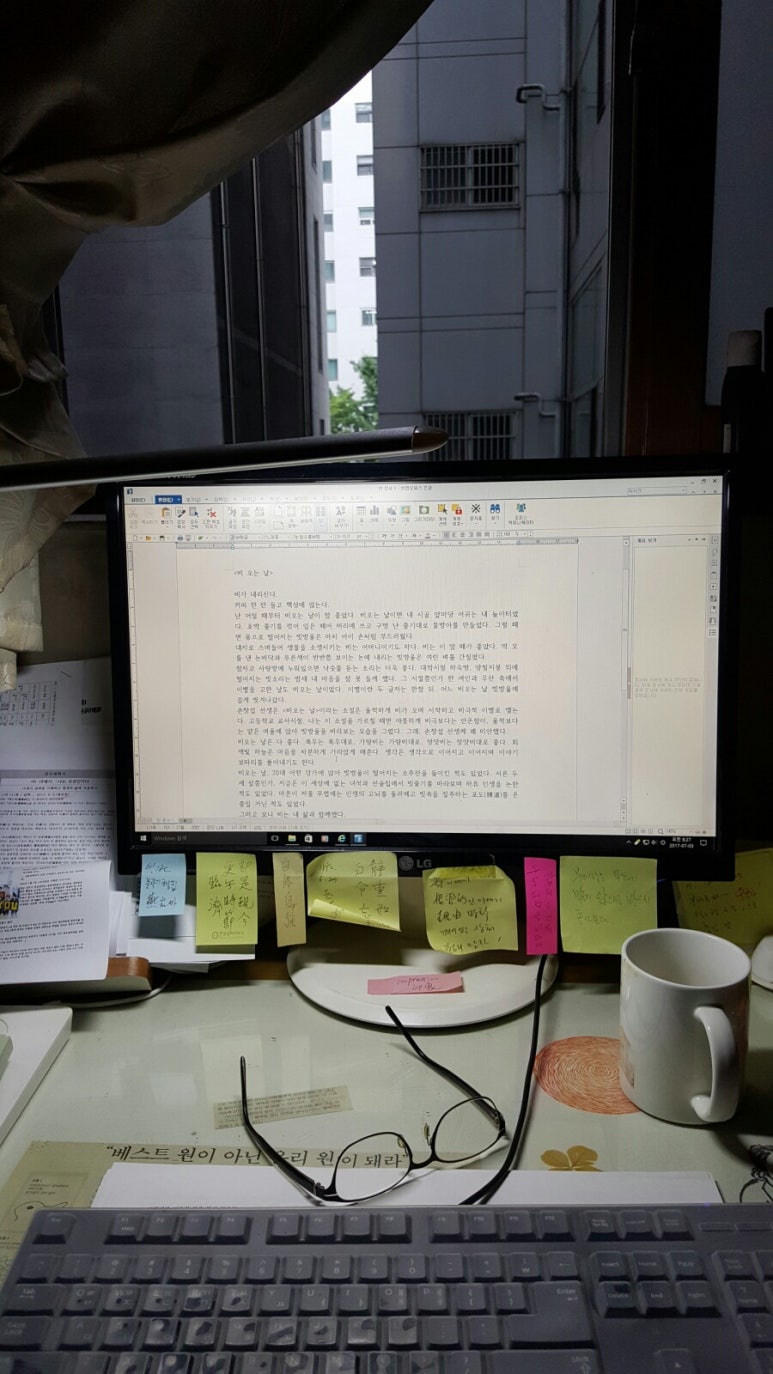
<비 오는 날>
비가 오신다.
내 시골에선 그렇게 말했다.
커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는다.
난 어릴 때부터 비오는 날이 참 좋았다. 비오시는 날이면 내 시골 앞마당 어귀는 놀이터였다. 호박 줄기를 꺾어 잎은 떼어 머리에 쓰고 구멍 난 줄기대로 물방아를 만들었다. 그럴 때면 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아이 손처럼 부드러웠다. 그런 날이면 마당가 하얀 찔레꽃에도 지팡나무에도 빗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대지로 스며들어 생물을 소생시키는 비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비는 이 맘 때가 좋았다. 막 모를 낸 논바닥과 푸른색이 반반쯤 보이는 논에 내리는 빗방울은 여린 벼를 간질였다. 물꼬를 보고 온 내 아버지가 빗물과 함께 마루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 쉬는 것도 이 맘 때 비오는 날이다. 어린 마음에도 고인 빗물에 떨어지는 빗방물이 그려내는 파문이 아름다운지 물결의 선율에 손가락을 가만히 대던 기억도 난다. 하릴없이 외양간 마주보는 사랑방에 누워 낙숫물 듣는 소리는 지금도 새록하다.
대학시절 하숙방, 양철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밤새 내 마음을 잠 못 들게 했다. 그럴 때면 룸메이트와 어쭙잖은 담론으로 담배꽁초깨나 찾았으리라. 그 시절쯤인가 한 여인과 우산 속에서 이별을 고한 날도 비오는 날이었다. 이별이란 두 글자는 한참 뒤, 어느 비오는 날 빗방울에 곱게 씻겨나갔다.
손창섭 선생의 <비오는 날>이라는 소설은 울적하게 비가 오며 시작해 비극적 이별로 맺는다. 고등학교 교사시절, 나는 이 소설을 가르칠 때면 야릇하게 비극보다는 안온함이, 울적보다는 얕은 여울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다. 그래, 손창섭 선생께 꽤 미안했다.
비오는 날은 다 좋다. 빗소리를 듣고 잠 든 날도 좋지만 빗소리가 나뭇잎에 후드득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깬 날은 뭔가 특별한 날인 듯하다. 폭우는 폭우대로, 가랑비는 가랑비대로, 장맛비는 장맛비대로 좋다. 회색빛 하늘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해준다. 생각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도 한다.
비오는 날에는 비오는 날만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스물여섯 살인가, 늦은 나이 군대생활의 괴롬을 비가 내리기에 마음껏 울며 걸은 적도 있었다. 서른 두세 살쯤인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녀석과 선술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하류 인생을 논한 적도 있었다. 마흔다섯 비오는 날, 담벼락과 같은 세상에 영원한 결별장을 던지고 올랐던 도봉산 포대능선에서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굵은 빗줄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 마흔이 저물 무렵, 꺼지지않는 인생의 고뇌를 한짐 지고 빗속을 질주하는 검은 포도(鋪道)를 온종일 거닌 적도 있었다. 쉰이 넘어 아이들과 국토대장정을 할 때, 비를 맞으며 대지를 걷는 맛은 여간해선 얻어보지 못할 비오는 날 맛 중의 맛이었다.
그러고 보니 비는 내 삶과 함께 했다.
오늘도, 아니 엊그제부터 비가 오신다. 고된 가뭄 끝에 오는 비라 더욱 좋다. 오늘 같은 날, 허름한 술집 귀퉁이에서 막걸리 한 잔에 부침개 한 장, 인생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눌 이가 있다면 꽤 좋겠다.
'삶(각종 수업 자료) >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헤어드라이기 이름값 고(考) (0) | 2018.02.28 |
|---|---|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운운을 듣고> (0) | 2017.11.13 |
| 솔직한 오만함 (0) | 2017.05.31 |
| 달과 6펜스 (0) | 2017.05.29 |
| 아! 18세기, 실학의 세계를 보다.- 나는 조선인이다. (0) | 2017.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