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5. 09:04ㆍ신문연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710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22) 신호질(新虎叱), 이놈아! 구린내가 역하구나! (1) - 인천일보
‘인(人,사람)’과 ‘물(物,동물)’은 상대적이다. ‘인’의 처지에서 ‘물’을 보면 한갓 ‘물’이지만, ‘물’의 처지에서 ‘인’을 보면 ‘인’도 또한 하나의 ‘물’일뿐이다. 연암 박지원
www.incheo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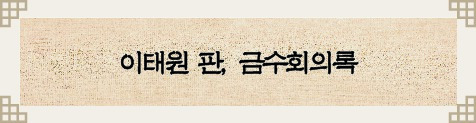
‘인(人,사람)’과 ‘물(物,동물)’은 상대적이다. ‘인’의 처지에서 ‘물’을 보면 한갓 ‘물’이지만, ‘물’의 처지에서 ‘인’을 보면 ‘인’도 또한 하나의 ‘물’일뿐이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여초책(與楚幘,초책에게 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냄새나는 가죽부대 속에 몇 개의 문자를 조금 지니고 있는 데 불과할 따름이오. 그러니 매미가 저 나무에서 울음 울고, 지렁이가 땅 구멍에서 울음 우는 것도 역시 사람과 같이 시를 읊고 책을 읽는 소리가 아니라고 어찌 안다하겠소?(吾輩臭皮帒中 裹得幾箇字 不過稍多於人耳 彼蟬噪於樹 蚓嗚於竅 亦安知非誦詩讀書之聲耶)” 또 「호질(虎叱,범의 호통)」에서도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다. 범이 참으로 악하다면 사람 또한 악하다.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면 범의 성품도 선하다.(夫天下之理一也 虎誠惡也 人性亦惡也 人性善則虎之性亦善也)”하였다.
담헌 홍대용 선생도 『의산문답(毉山問答,의무려산에서 대화)』에서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미천하지만, 사물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미천하고, 하늘의 견지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모두 균등하다(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하였다. 인성과 물성이 고르다는 이 ‘인물균(人物均)’이나 인성과 물성은 분별할 수 없는 ‘인물막변(人物莫辨)’을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이라한다.
이러고 보니 사람이 범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것 또한 동등한 이치다. 더욱이 범은 지혜와 덕이 훌륭하고 사리에 밝으며 문무를 갖추었고 자애롭고 효성이 지극하며 슬기롭고도 어질며 빼어나게 용맹하고 장하고도 사나워 그야말로 천하에 적수가 없다. 이런 범의 위풍에 사람은 동물 중에서 가장 범을 두려워한다. 어느 날, 범이 창귀(倀鬼, 범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다. 창귀가 되어 넋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범을 섬기며 먹을거리를 찾아 늘 앞장서서 인도한다)를 불러서는 말한다.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어디 먹을 것 좀 없을까?”
굴각(屈閣, 범이 첫 번째로 잡아먹은 사람의 혼령으로 범의 겨드랑이에 착 달라붙어 있다)과 이올(彛兀, 범의 광대뼈에 붙어살며 범이 두 번째로 잡아먹은 사람이다. 역시 범의 최측근이다), 육혼(鬻渾, 범의 턱에 붙어산다. 범이 세 번째 잡아먹은 사람 혼령으로 평소에 아는 친구들의 이름을 죄다 주어 섬겨 바친다)이란 창귀들이 서로 추천을 해댄다.
이올이가 먼저 말했다.
“저 동문 밖에 의원과 무당이란 놈들이 있는데 잡수실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범이 수염을 뻗치고 불쾌함을 얼굴빛에 드러내며 말한다.
“의원의 의(醫)라 하는 것은 ‘의심할 의(疑)’자 아니냐. 또 무당의 무(巫)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대는 ‘속일 무(誣)’자 아니냐? 그래, 나보고 그런 자들을 먹으라는 거냐.”
그러자 육혼이가 말했다.
“저 법에 대해 내로라한다는 놈이 있습니다.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개를 가진 것도 아닌 키는 칠 척쯤인 머리 검은 물건이지요. 허우대가 커 뜨문뜨문 엉거주춤 걷는 걸음걸이하며 체머리를 도리도리 흔드는 놈인데, 자칭 어진 간과 의로운 쓸개, 충성을 끌어안고 가슴속에는 깨끗함을 지녔다 자부하고 또 풍류를 머리에 이고 예의를 밟고 다니며 입으로는 여러 법 이론으로 주장을 내세웁니다. 또 강단과 주견이 있고 상대와 싸우면 반드시 지는 법이 없으며 영혼까지 탈탈 털어내야 끝장을 내고야 만답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은, 그가 단순 무지한데도 사물의 이치를 꿰뚫었다는 도사들까지 옆에 두었다며 그 이름을 ‘석법지사(碩法之士, 큰 법을 지닌 선비)’라 부르고 받들어 모십니다. 등살이 두두룩한 것이 몸이 기름져서 맵고, 시고, 짜고, 쓰고, 단, 다섯 가지 맛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범님의 입맛에 맞으실 듯합니다.”
그제야 범은 기분이 좋아 눈썹을 치켜세우고는 침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껄! 껄! 껄!” 웃었다.
“그래, 그 놈이 좋겠다. 그 놈이 어디 있느냐?”
“저 남문 밖 남산골을 따라 울멍줄멍 내려가다 보면 할머니 젖가슴처럼 펑퍼짐하니 슬프게 납작 엎드린 이태원(梨泰院)에 있습니다. 이태원이 본래 올라가고 내려오고 질러가는 세 갈래 길이라 온갖 금수들은 다 모여듭니다.”
이리하여 범은 굴각이와 육혼을 좌우에 따르게 하고 이올이를 앞세우고 이태원으로 내려왔다.
때마침 이태원에서는 금수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큰 휘장을 친 곳에 다섯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렸으니 ‘금수회의소(禽獸會議所)’라. 모든 길짐승, 날짐승, 버러지, 물고기 등 물이 들어와 꾸역꾸역 서고 앉았는데 의장인 듯한 한 물건이 들어온다. 머리에는 금색이 찬란한 큰 관을 쓰고 몸에는 오색이 영롱한 의복을 입고 턱하니 의장석에 올라서서 한 번 읍하니 위의가 제법 엄숙한 것으로 미루어 석법지사가 분명했다. 둘레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검은 법복을 입고 앉아 서슬 퍼런 눈알을 데굴데굴 굴려댔다. 석법지사는 방망이를 썩 들더니 “땅! 땅!” 두드리며 거만한 태도로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이 글은 연암 박지원의 「호질」과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 일부 문장과 어휘들을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다음 회(23회)에 계속>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신문연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27) 후생가외(後生可畏), '씨알 데 있는 말'을 하는 선생이라야 (0) | 2023.02.13 |
|---|---|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25) 신호질(新虎叱), 이 선비놈아! 구린내가 역하구나! (4) (2) | 2023.01.09 |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19) 선생(先生), 행동이 바르고 그 입이 깨끗하다 (0) | 2022.10.03 |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17) 책문(策問),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0) | 2022.09.05 |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16) 희담민막(喜談民瘼), 분노하라! 그래야 세상은 변한다. (0) | 2022.08.22 |